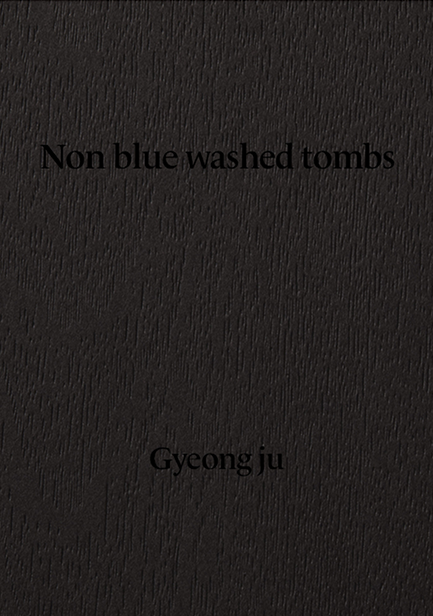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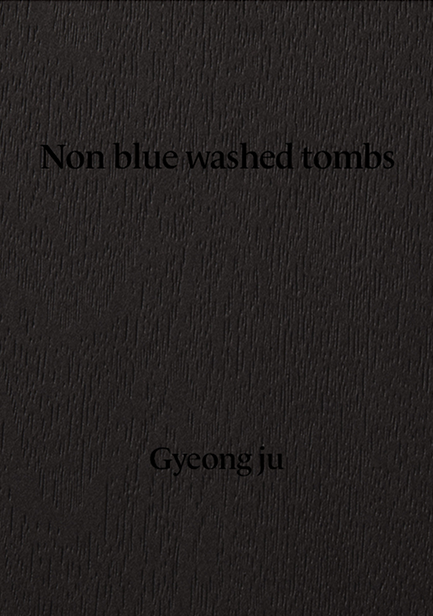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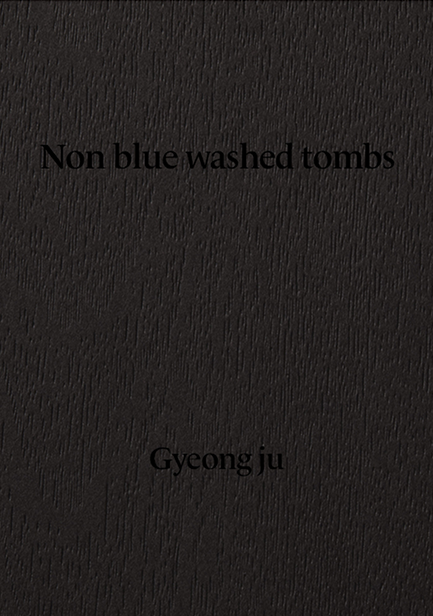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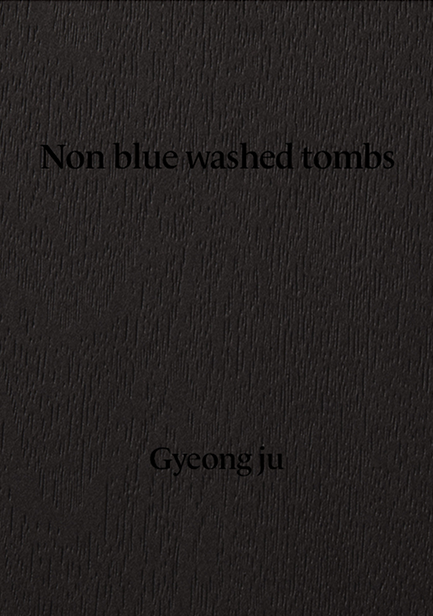
<책소개>
For pigs, and others who need this, always.
경주, 무덤, 아우슈비츠 수용소, 흙더미 등으로 상징되는 죽음이란 이미지 앞에서
아직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한, 무덤 바로 곁에 자리를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풍경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때의 돼지는 저이기도 하고, 제가 사랑하던 대상이기도 하고, 저를 지켜주던 것이기도 하고,
저를 위태롭게 하던 것이기도 하고, 제가 망치고 죽이고 다 먹어 치운 후에도
미안해할 줄은 모르던 것들이기도 해요.
매년마다 수만의 돼지가 땅에 묻힌다.
우리는 지난 10년 간 전염병 예방을 위해 7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생매장했다.
란드 오시비엥침의 수용소에서 경주의 무덤으로 매듭 지어진 돼지에 관한 이야기.
무덤과 같은 흙더미로, 탈 것에 실려 땅으로. 흙에서 흙으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
<책 속으로>
I love Gyeongju as it allows me to drift away, no matter how hard I try to get lost. I can be wandering around freely because the scene I’ve encountered eventually stretches out. Cheomseongdae-like things are everywhere, making me feel safe… That being able to roam from place to place in peace seemed to indicate that they’ve accepted me; you may live here; you are not a stranger here. And the city life of Gyeongju is surrounded by graves. This leaves me with no choice but to do the lengthy task of checking the texture of death that coexists right next to life. One of my favorite poets, Mun-jae Lee, wrote <Old Prayer>. It says praying is ‘just granting the plain truth that my death always accompanies my life.’ Therefore, the people of Gyeongju must have mastered the essence before they were born. (⌜Dear Gyeongju, dear⌟, 31쪽)
Going up and down the Oswiecim side for half a year, I felt the wind was strong there. The wind was like a soul. Passing by the rows of tombs and tombstones piled up everywhere, I realized that Oswiecim resembles Gyeongju. The first day I walked through the camp area, I imagined a picture that would fit words like wars or ruins. Perhaps I was expecting a sense of mystery to be conveyed without the sound of pain; I might have wanted to experience the tragedy of the falling world war as if it were a haunted house in an amusement park recalling the destroyed ruins. But there was a person there. Just like in Gyeongju, even when the tomb was right next door, there were people who built their houses on their place. From there I scoop up the times when I was forced to face the scene of death no matter where I go. I was longing for those living in Gyeongju because I had feared death. (⌜Dear Gyeongju, dear⌟, 31쪽)
경주는 온 동네가 비밀 스럽습니다. 어디엔가 시간을 역행하는 장치를 숨기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면 옛 시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누군가를 숨죽여 기다려야 만 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로 걷든지 결국 아는 장면이 펼쳐져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는 경주를 좋아합니다. 첨성대 같은 게 도처에 널려 안전함을 느끼는... 그 마음 놓고 길 잃을 수 있음이 나를 받아준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여기에 살아도 된다, 너는 여기에 이방인이 아니다, 하고요. (⌜경주에게⌟, 31쪽)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때의 일입니다. 반년에 걸쳐 오시비엥침 지역을 오르내리며 그곳은 바람이 강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람은 영혼 같기도 했습니다. 줄지어진 무덤과 곳곳에 쌓인 비석을 지나다 문득 오시비엥침이 경주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용소 지역을 처음 걷던 날, 부끄럽지만 전쟁이나 폐허와 같은 단어에 어울릴 만한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즐비한 무덤이 고통의 소리는 없이 전달할 어떤 신비감을 기대했던 것이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파괴된 폐허를 떠올리며 쓰러져가는 세계 대전의 비극을 놀이동산 속 귀신의 집처럼 체험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경주처럼,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일에도 자기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주에게⌟, 31쪽)
<기본 서지>
저자명: Kim Gyeonghyeon
분야: 시/에세이 > 나라별 에세이 > 한국에세이
출판사명: 유월프레스
출판일자: 2022.01.15
정가: 14,360원
페이지수: 54쪽
도서길이: 182*257*7 B5

Non blue washed tombs / Kim Gyeongh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