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블루노트가 있었기에 ECM이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재즈 전문 레이블 블루노트는 1939년 시작되었다.
독일 이민자 둘이 시작한 전형적인 인디 레이블이었던 블루노트는, 흑인 뮤지션이 직접 장식하는 표지,
스튜디오의 현장감이 묻어나는 레코딩, 빛나는 스타들의 데뷔작을 선보이면서,
‘타협하지 않는 목소리’란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마니아들을 양산한다.
바다 건너 도쿄, 아이비룩에 심취했던 한 청년은 블루노트는 어느 작품이나 같은 사운드를 낸다는 사실,
고가의 스테레오 장비로 들은 것도 아닌데 거친 사운드가 전해진다는 점을 깨닫고,
이왕 재즈에 입문할 거라면 블루노트를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모아보자고 다짐한다.
그것이 1973년. 블루노트의 컴플리트 컬렉션은 그렇게 14년 뒤인 1987년 6월 21일, 일차적인 목표에 도달했다.
일차적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컬렉터가 컨디션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컬렉션에는 끝이 없다.
이 책은 블루노트를 만드는 우당탕탕 창업 스토리도, 존 콜트레인이나 마일스 데이비스의 쿨한 현대적 신화도 아닌,
1939년 시작된 블루노트의 모든 음반을 다 모은 극성스러운 컬렉터의 수기다.
유치하며 미시적이고 엘리트적이거나 오타쿠적인, 결국은 편집하기 까다로운 세계. 예상하셨겠지만,
이 책에는 라벨에 프린트된 주소가 뉴욕인지 뉴저지인지 레코드에 깊은 홈이 있는지 없는지 재킷이 코팅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는
사소한 논쟁이 가득하다.
다만 그루브가드니 이어 심볼이니 RVG 각인이니 찾는 컬렉터라는 이들은, 이 표면이 아니라, 표면에 기록되고,
그러다 표면을 넘어선 ‘소리’를 구한다.
이 책을 쓴 오가와는 컴플리트컬렉션을 달성하기까지 지하와 지상을 가리지 않고 중고 매장을 들락거렸고,
바다를 건너고,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돈을 쓰고, 시간을 썼다. 재즈를 찾는 데 생을 할애한 거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이들이 오가와를 찾는다.
오리지널을 가려달라고, 재킷을 빌려달라고, 글을 써달라고, 숍 가이드를 해달라고… 이번엔 재즈가 그를 찾아왔다.
그가 찾은 것이 그를 찾았다는 이야기… 철저하고 성실한 수용자는 또 하나의 창작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여전히 컬렉션의 길을 걷는다.
『블루노트 컬렉터를 위한 지침』 한국어판 역시 컬렉션의 대상이 되도록 만듦새에 심혈을 기울였다.
직접 음반을 수집하고 사입하고 판매하는 레코드숍 운영자의 번역은 미끈하기보다는 겸손하고도 친절하며,
본문은 재즈처럼 흘러가도록 여러 서체를 쓰되 어우러지게, 무엇보다 뮤지션과 음반 타이틀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했다.
컬렉션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의지로 되지만, ‘완성’을 위해서는 ‘우정’이 요구된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
출판사 나름의 노력과 의지로 선보이는 이 책이 ‘완성’되는 것은, 독자인 당신이 읽어주셨을 때다.
쪽수: 360p
판형: 120*208mm
가격: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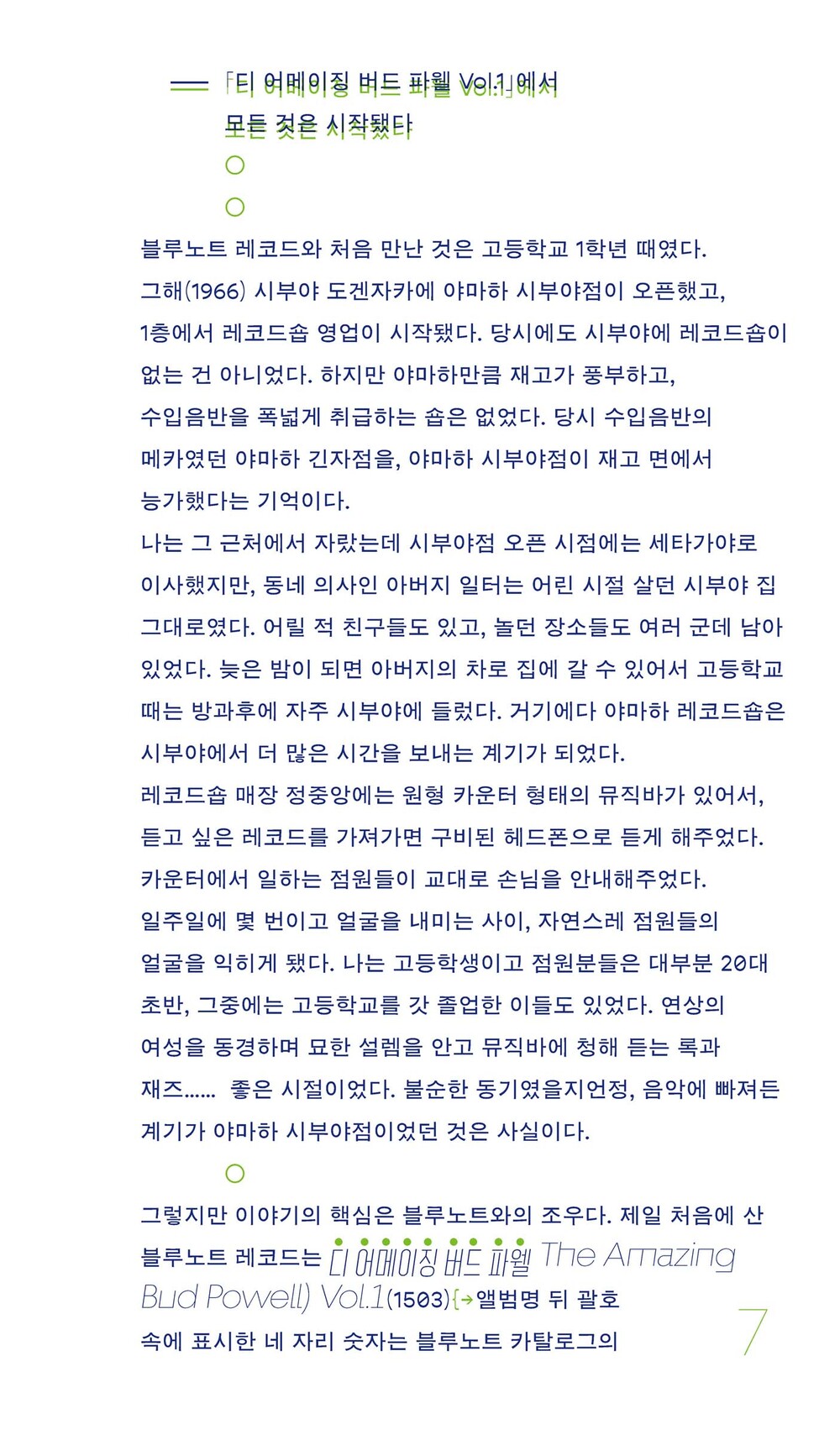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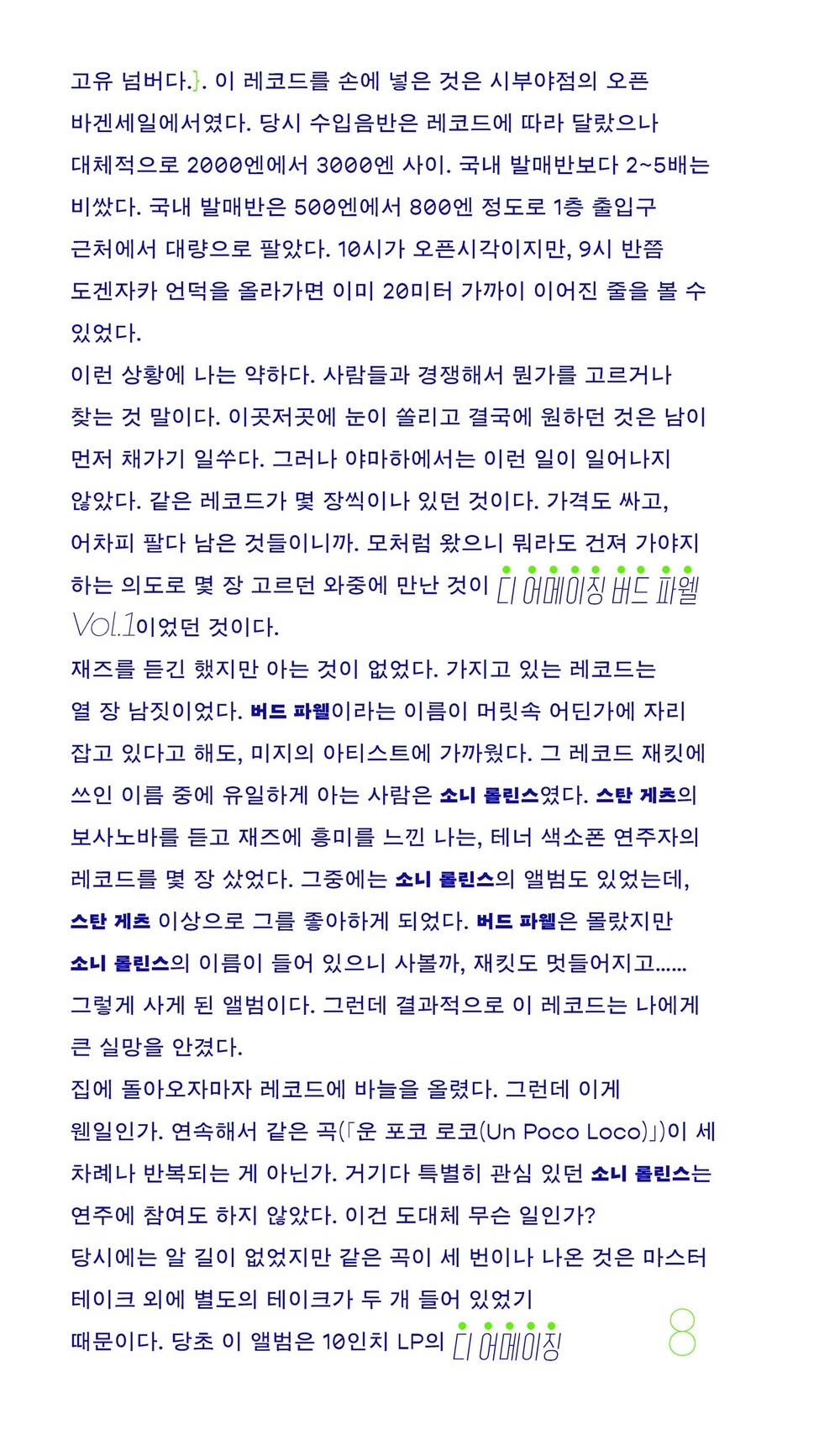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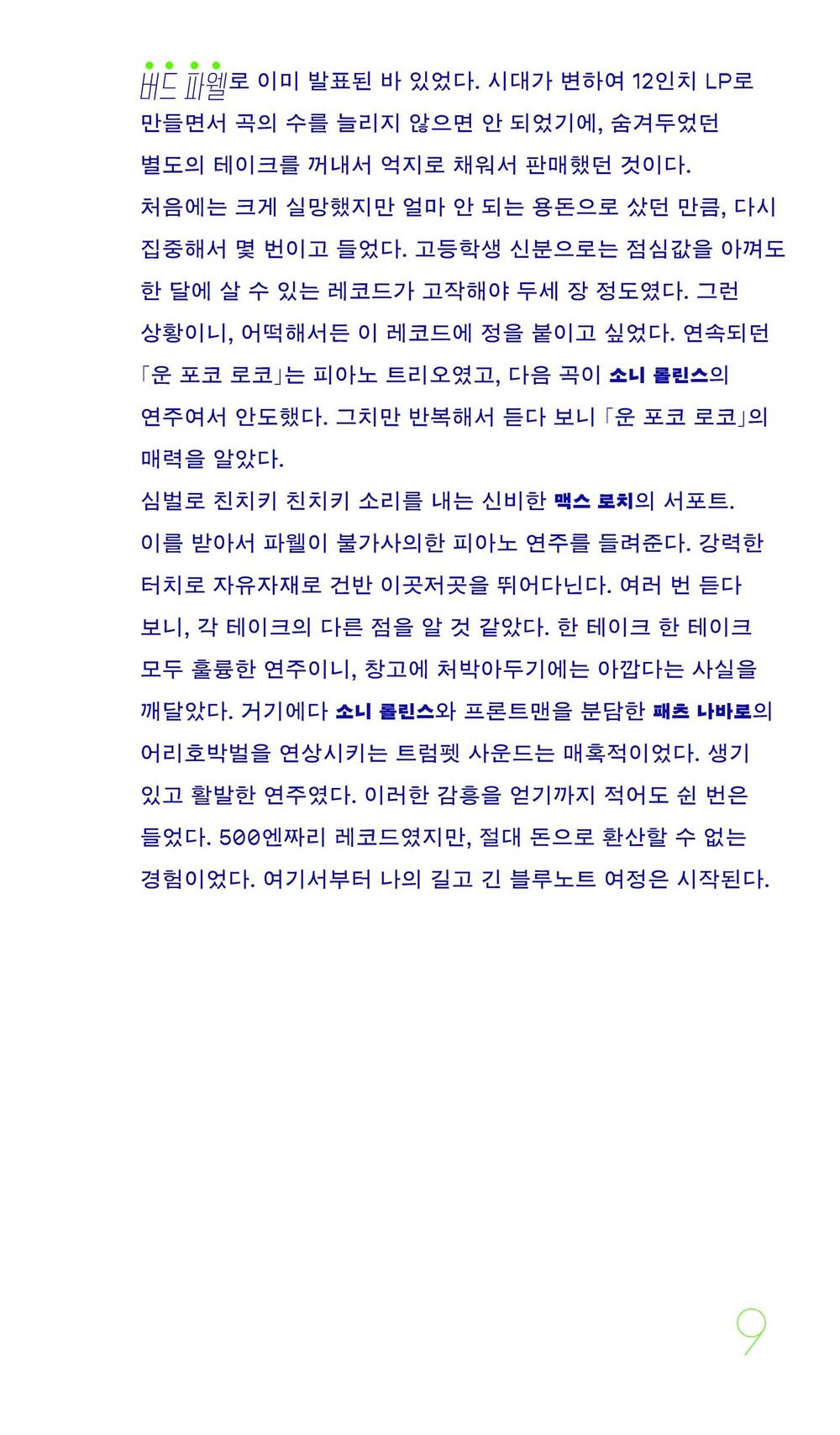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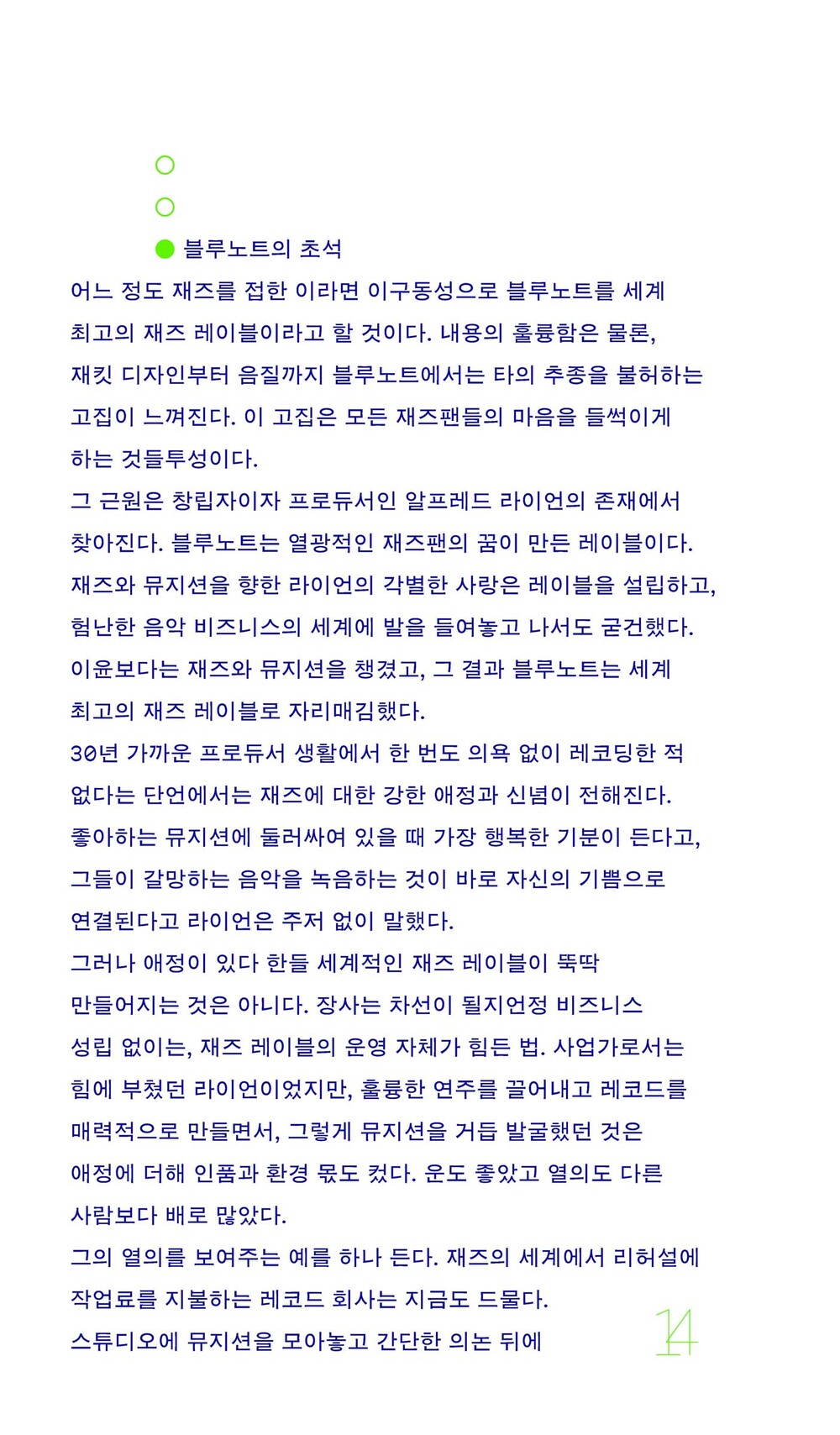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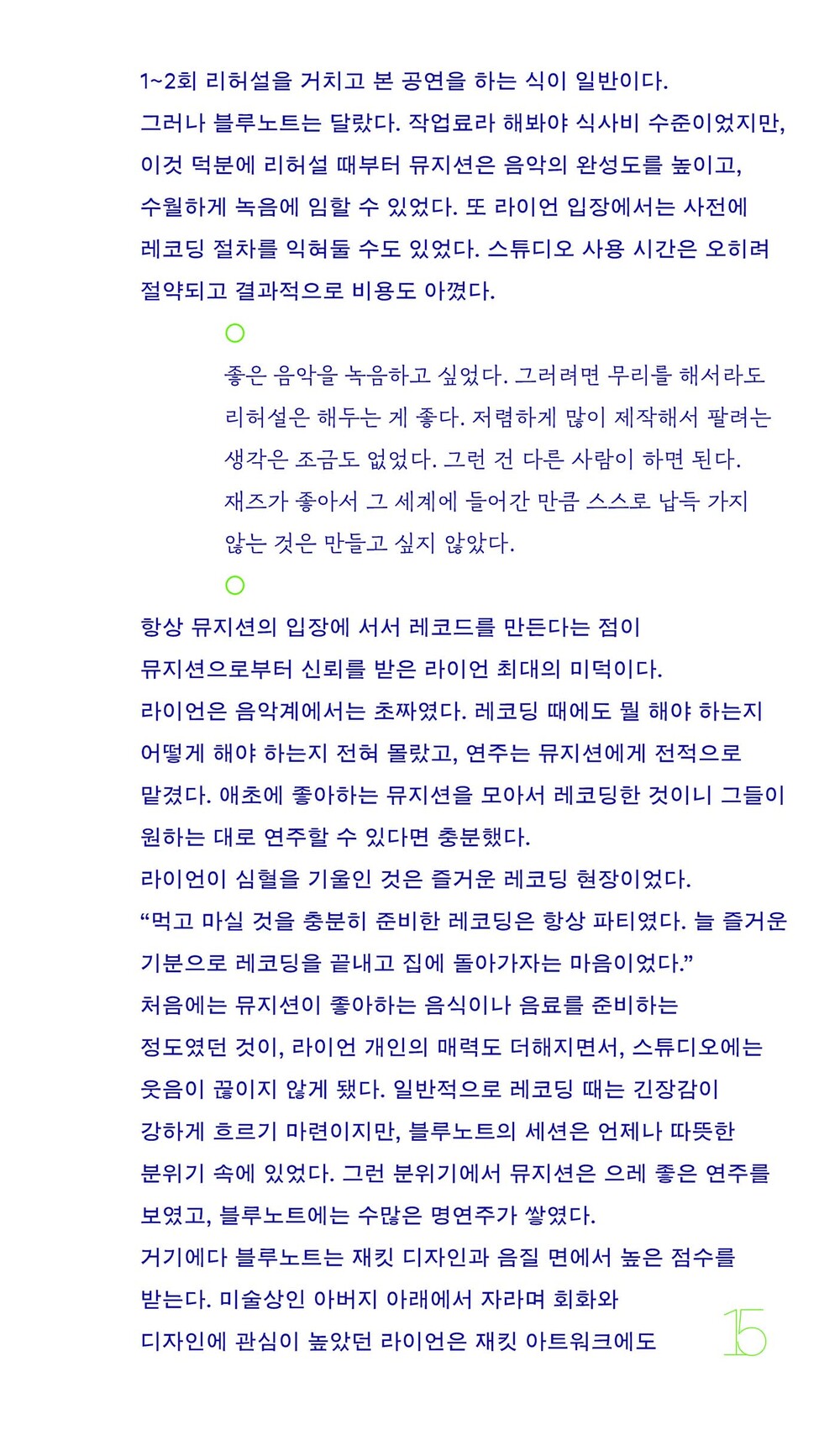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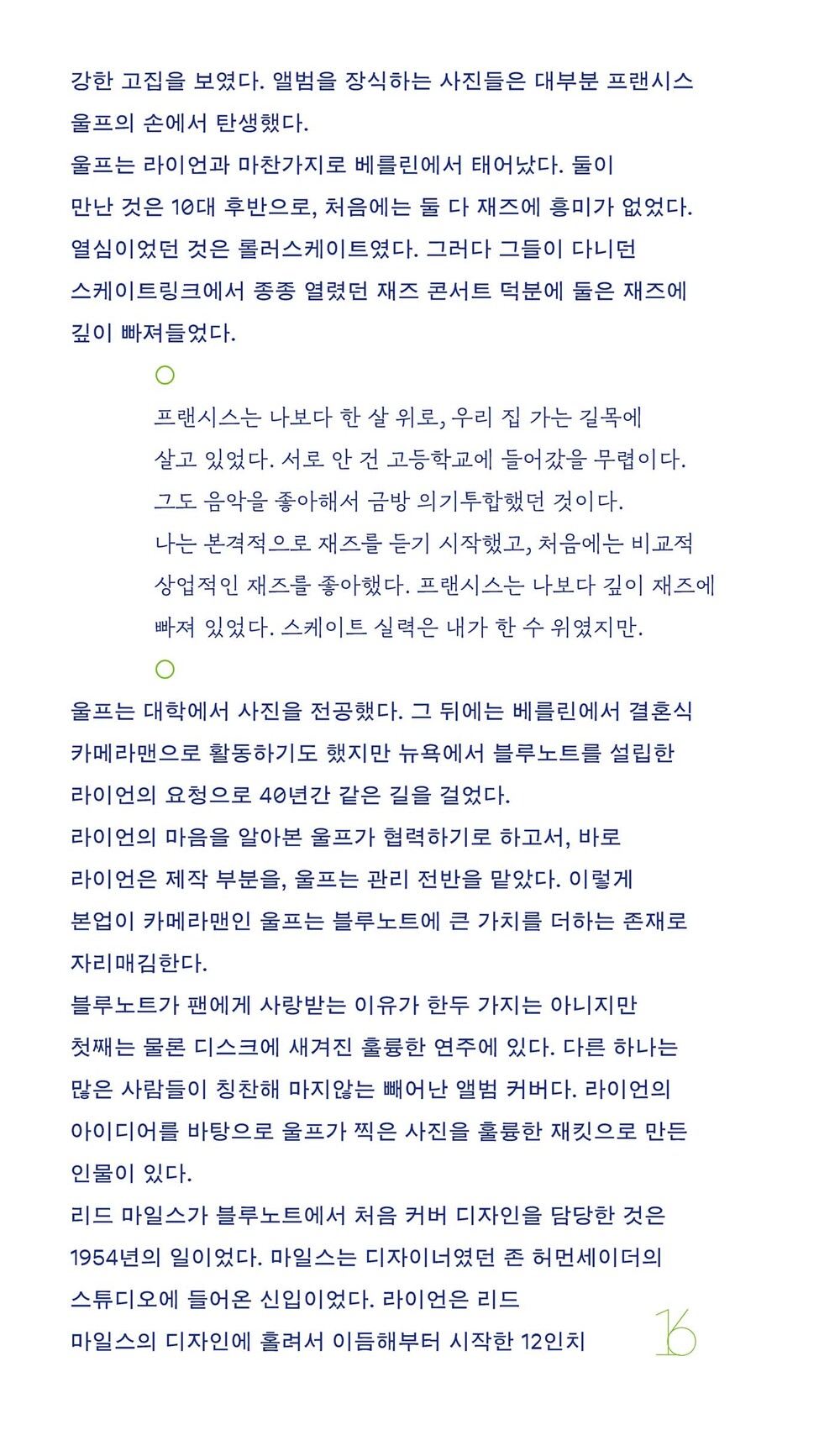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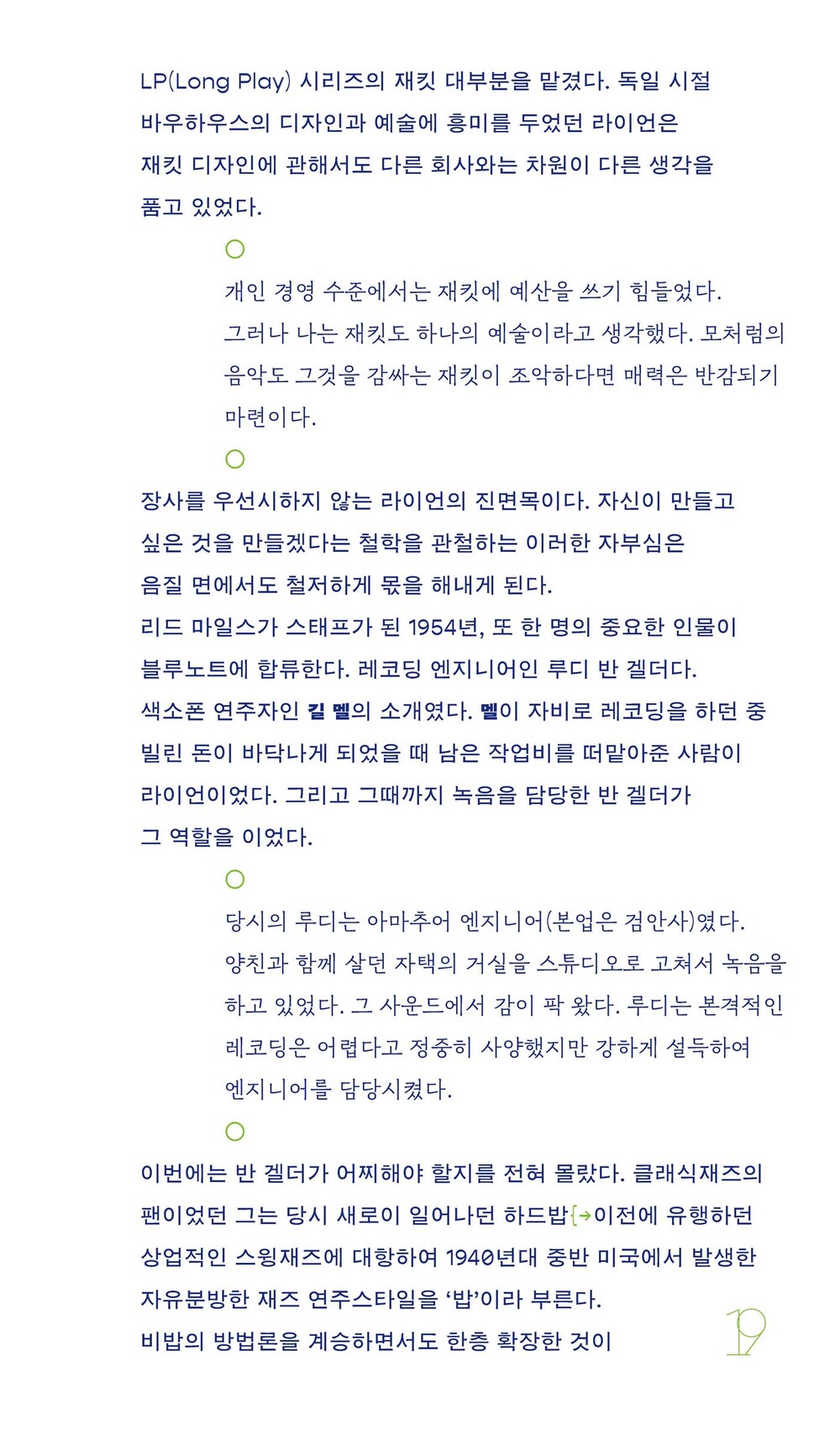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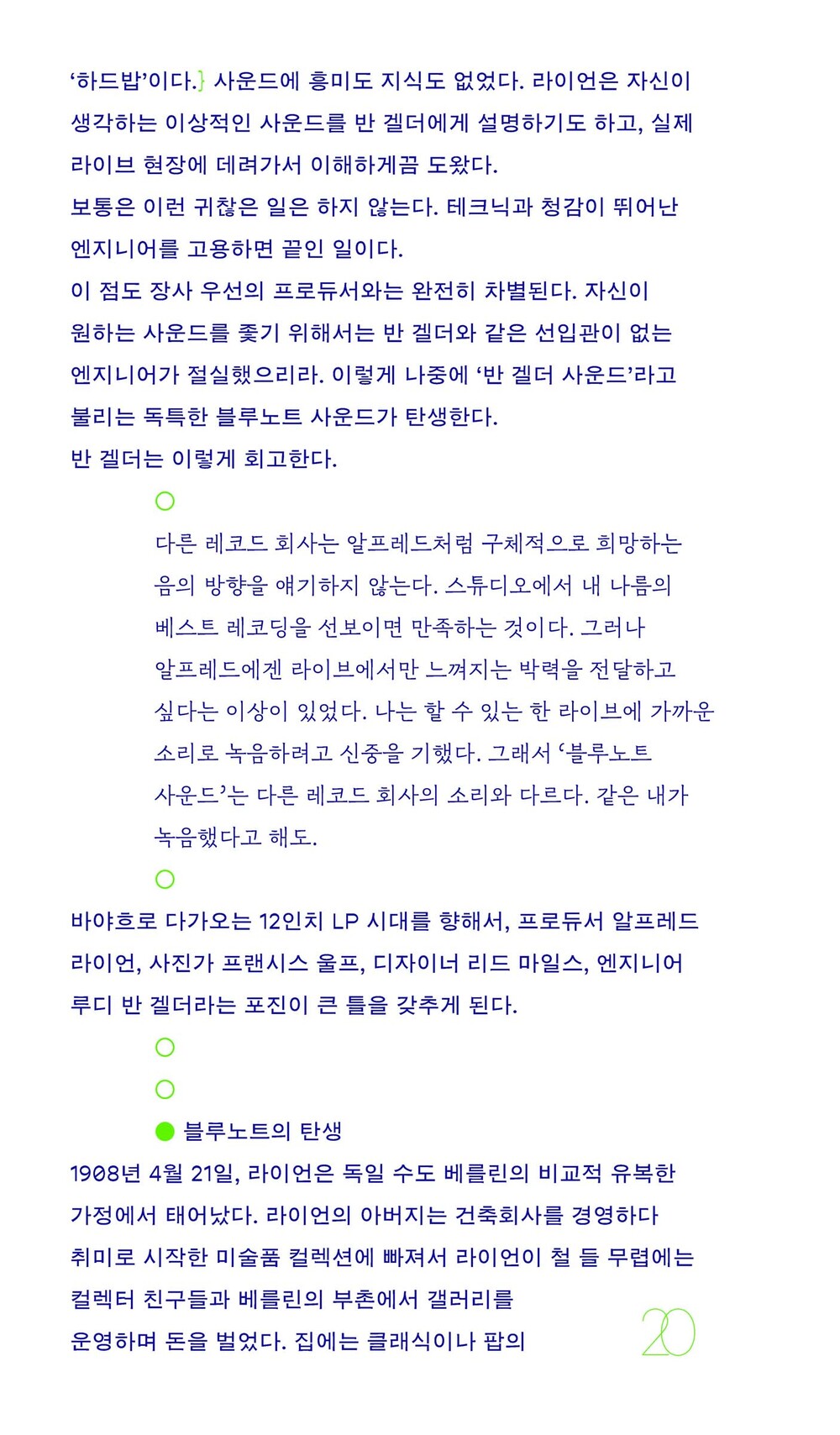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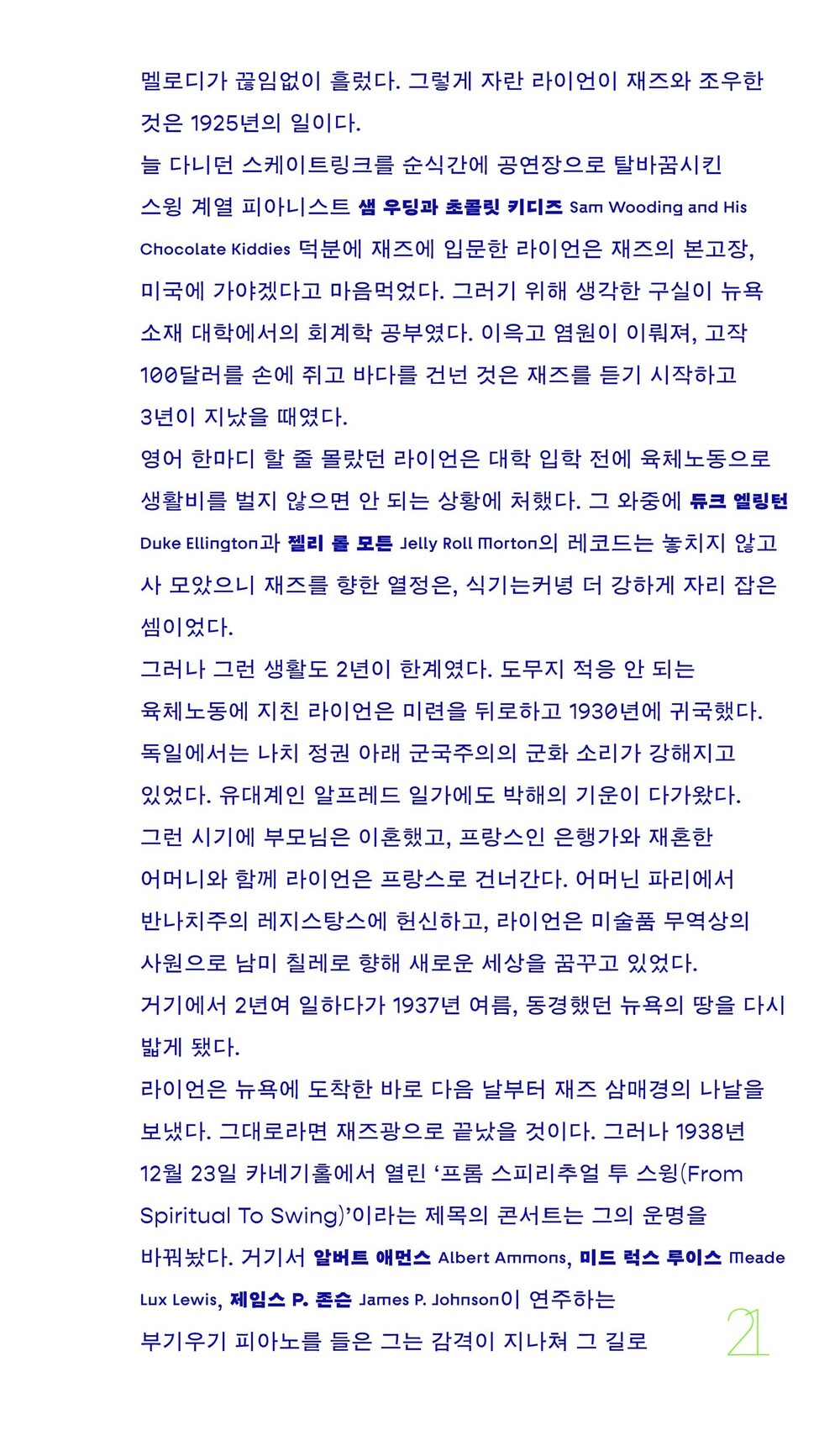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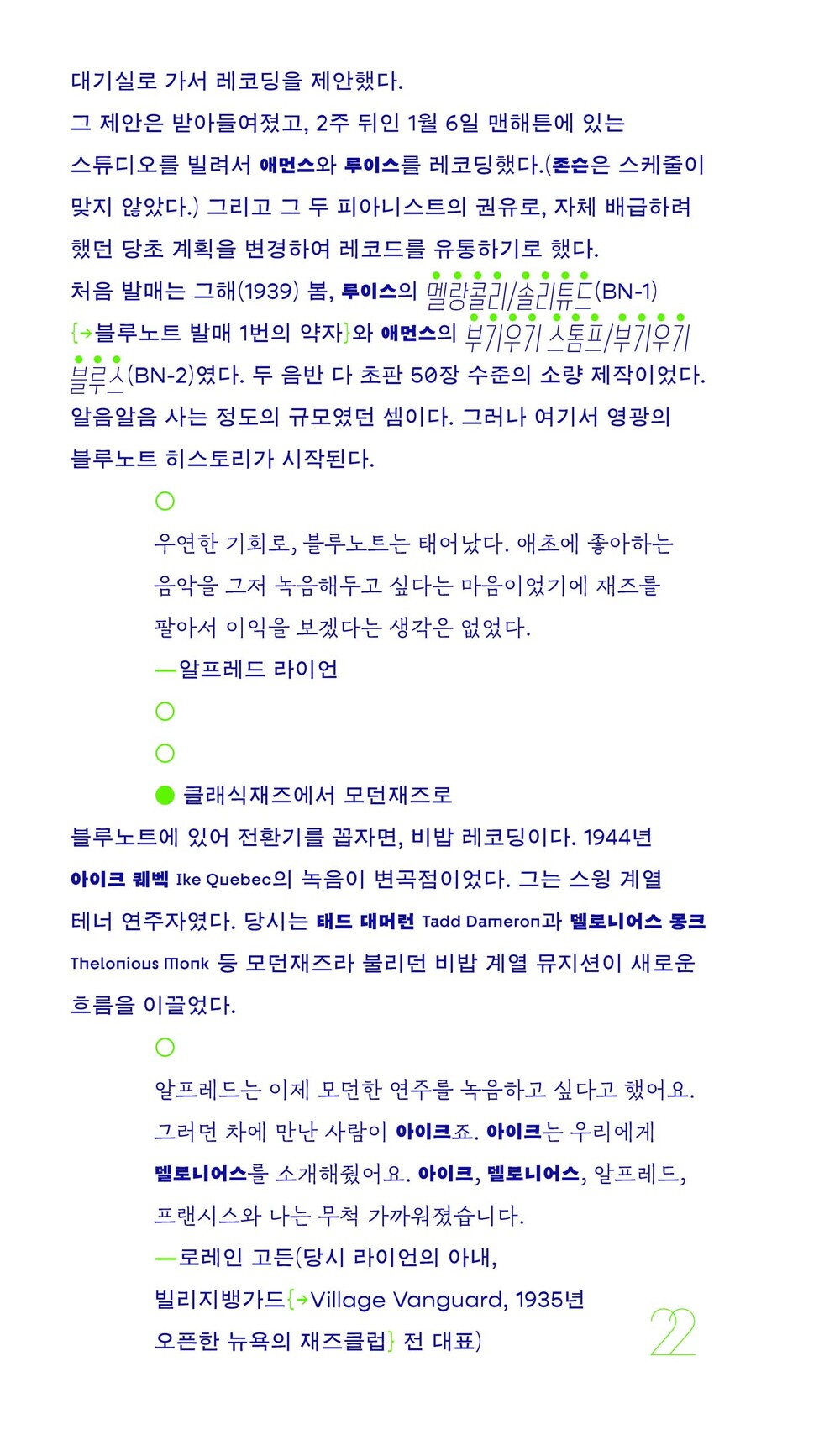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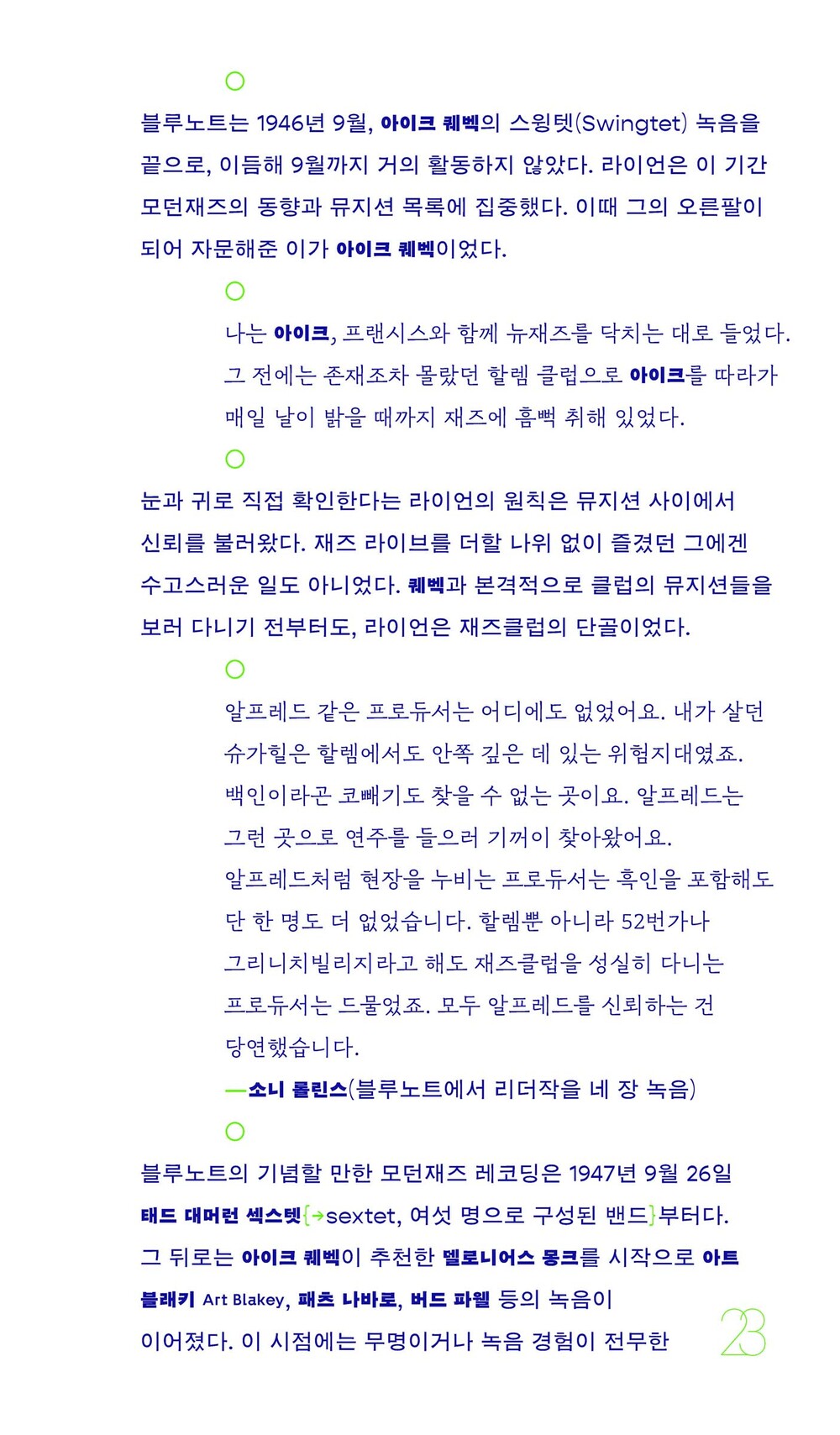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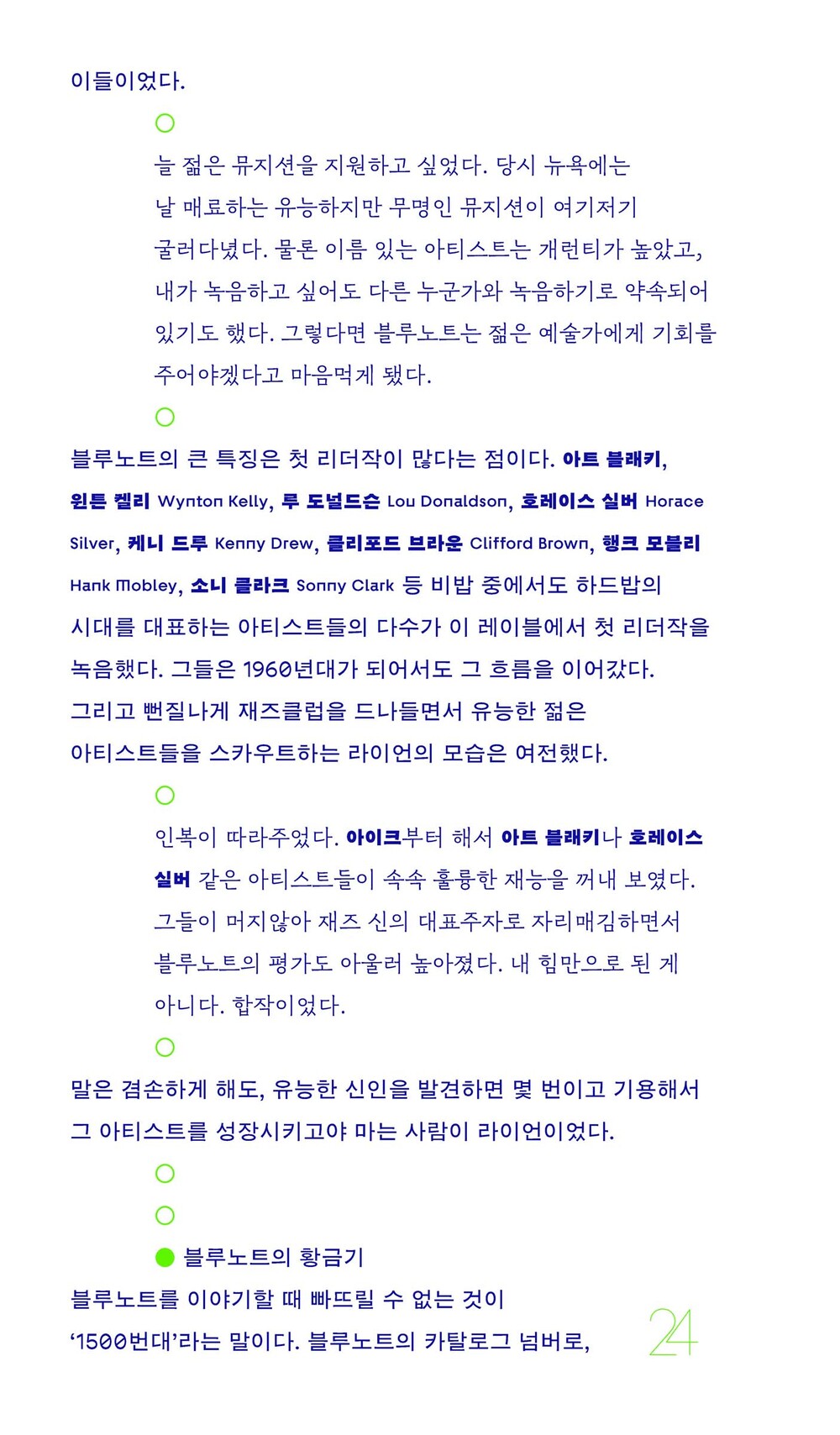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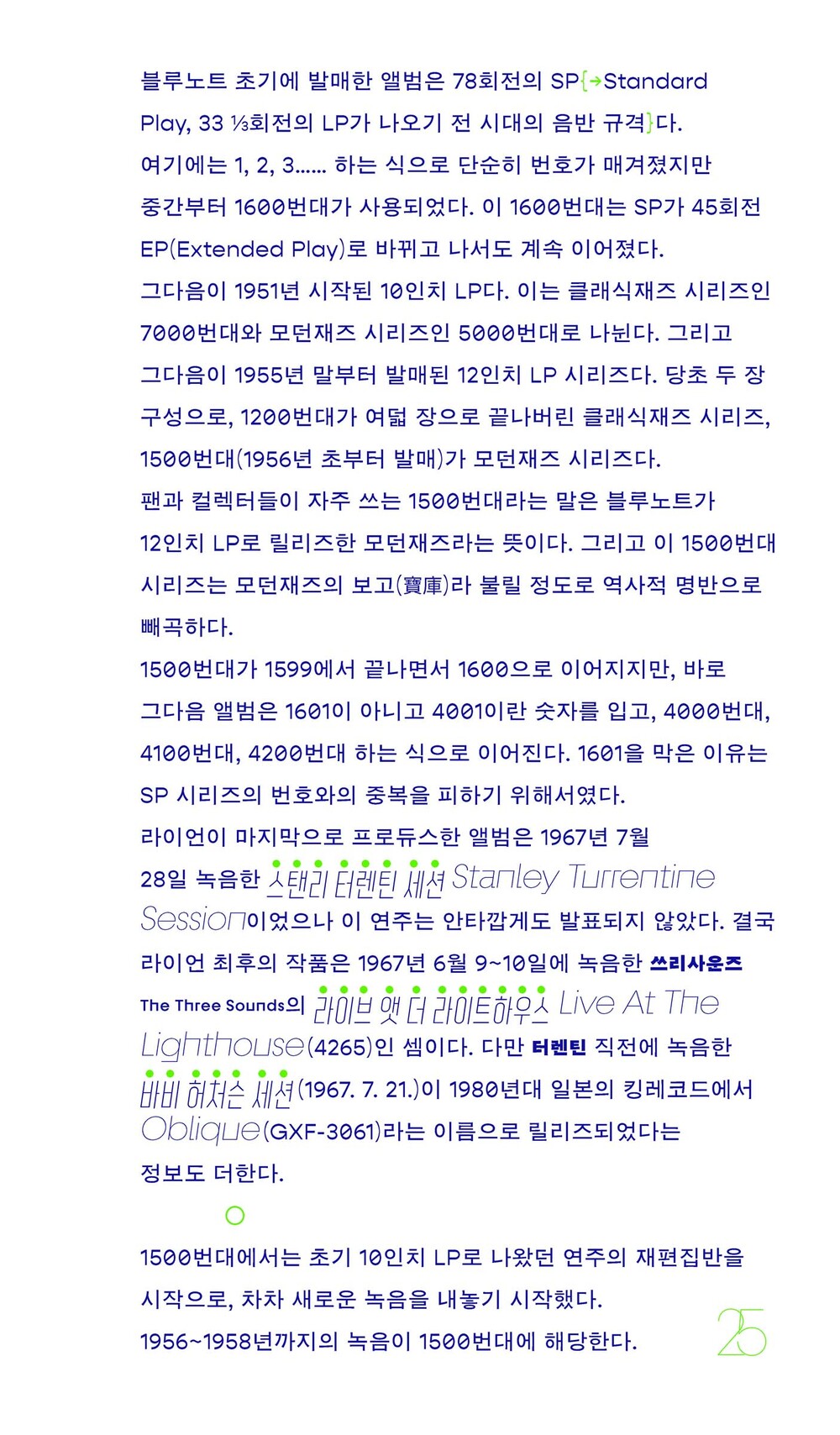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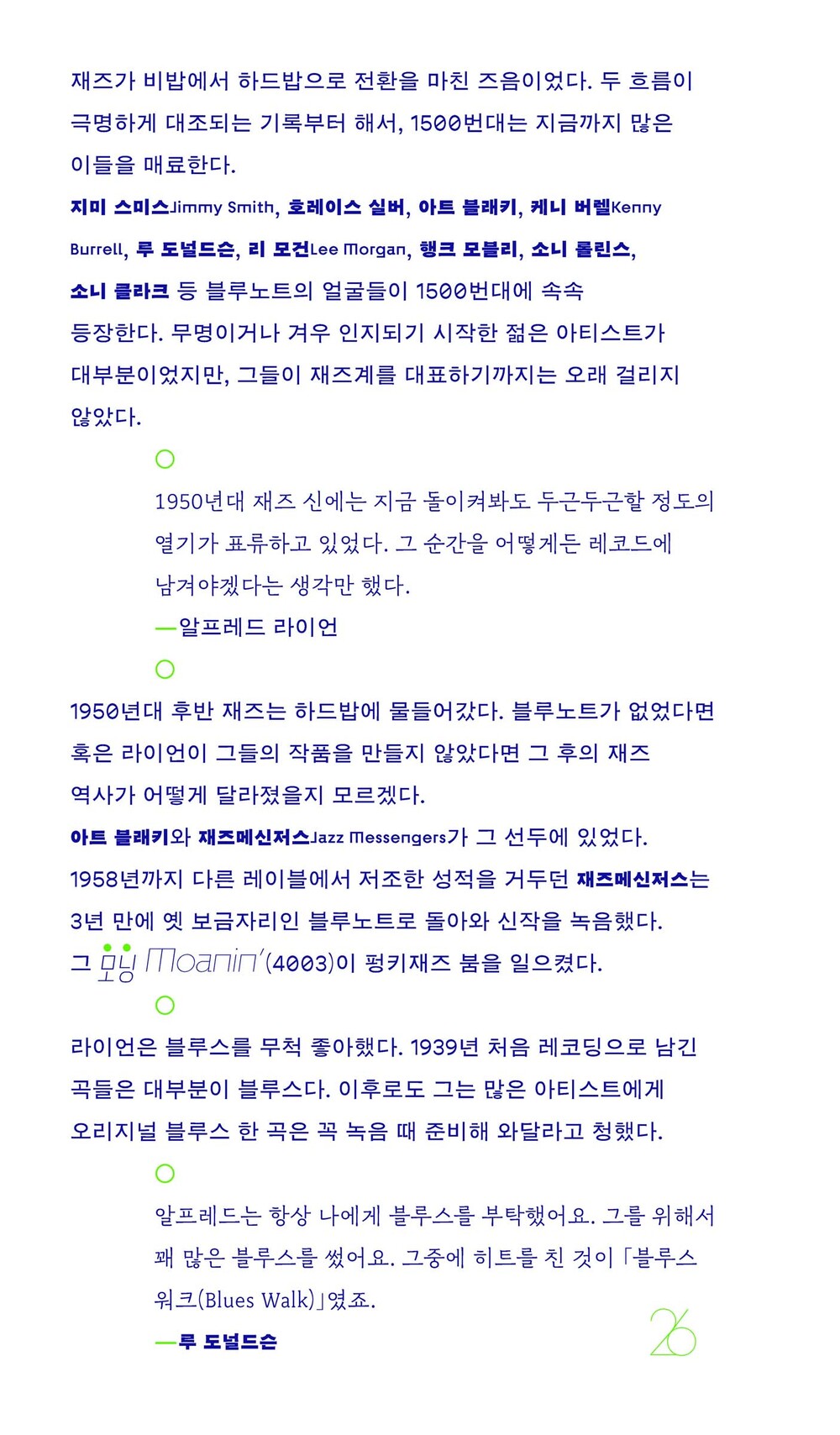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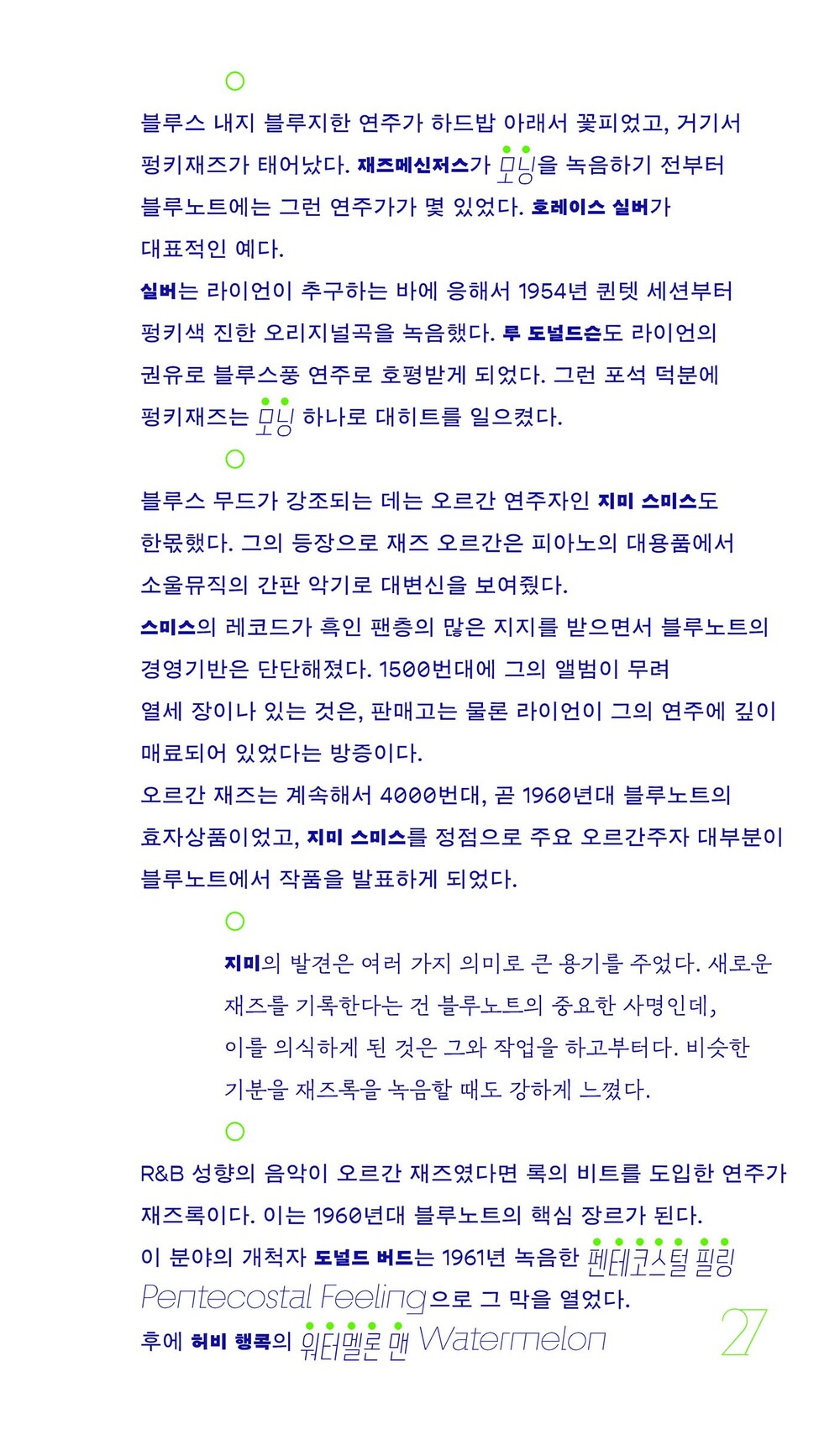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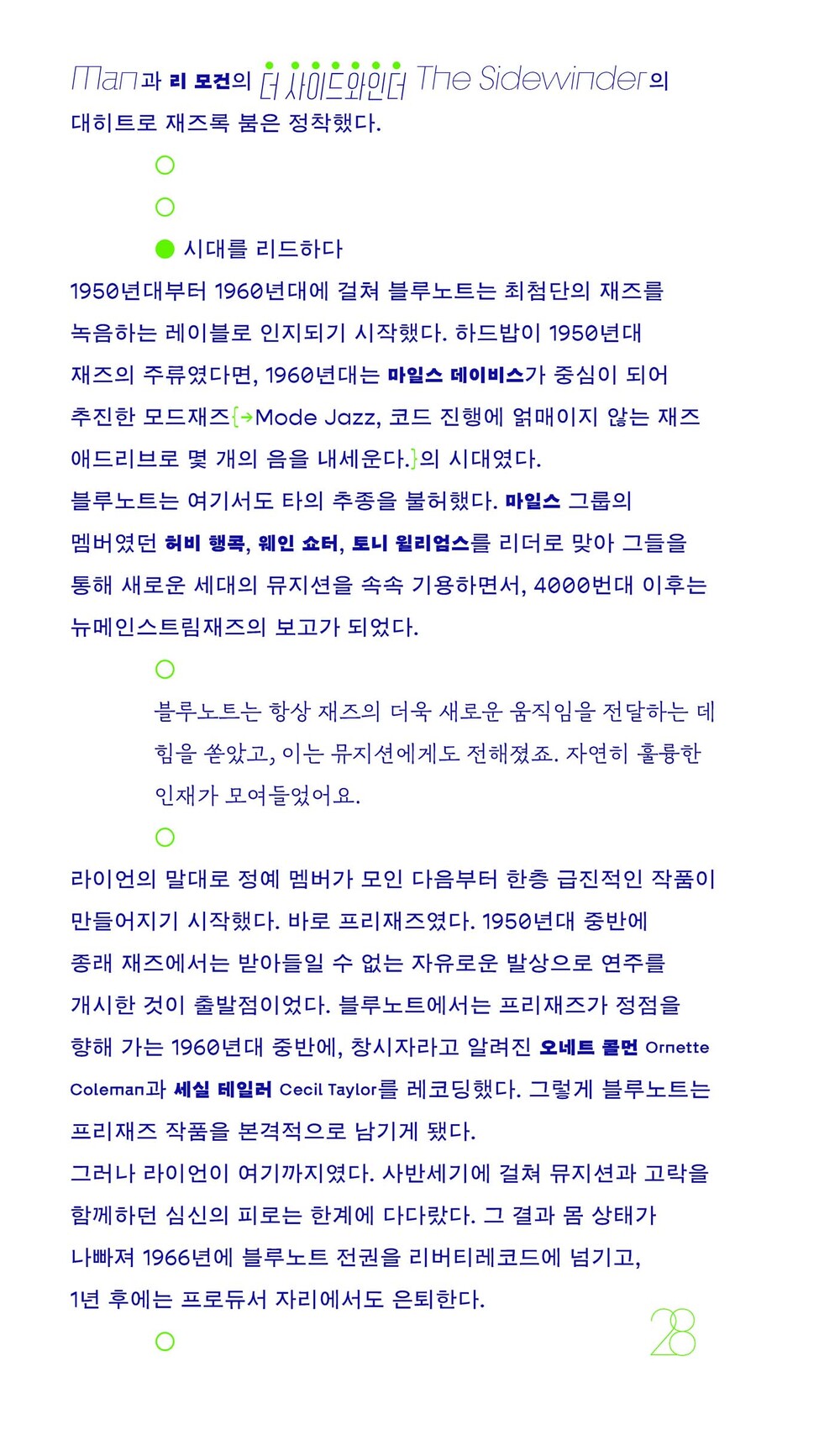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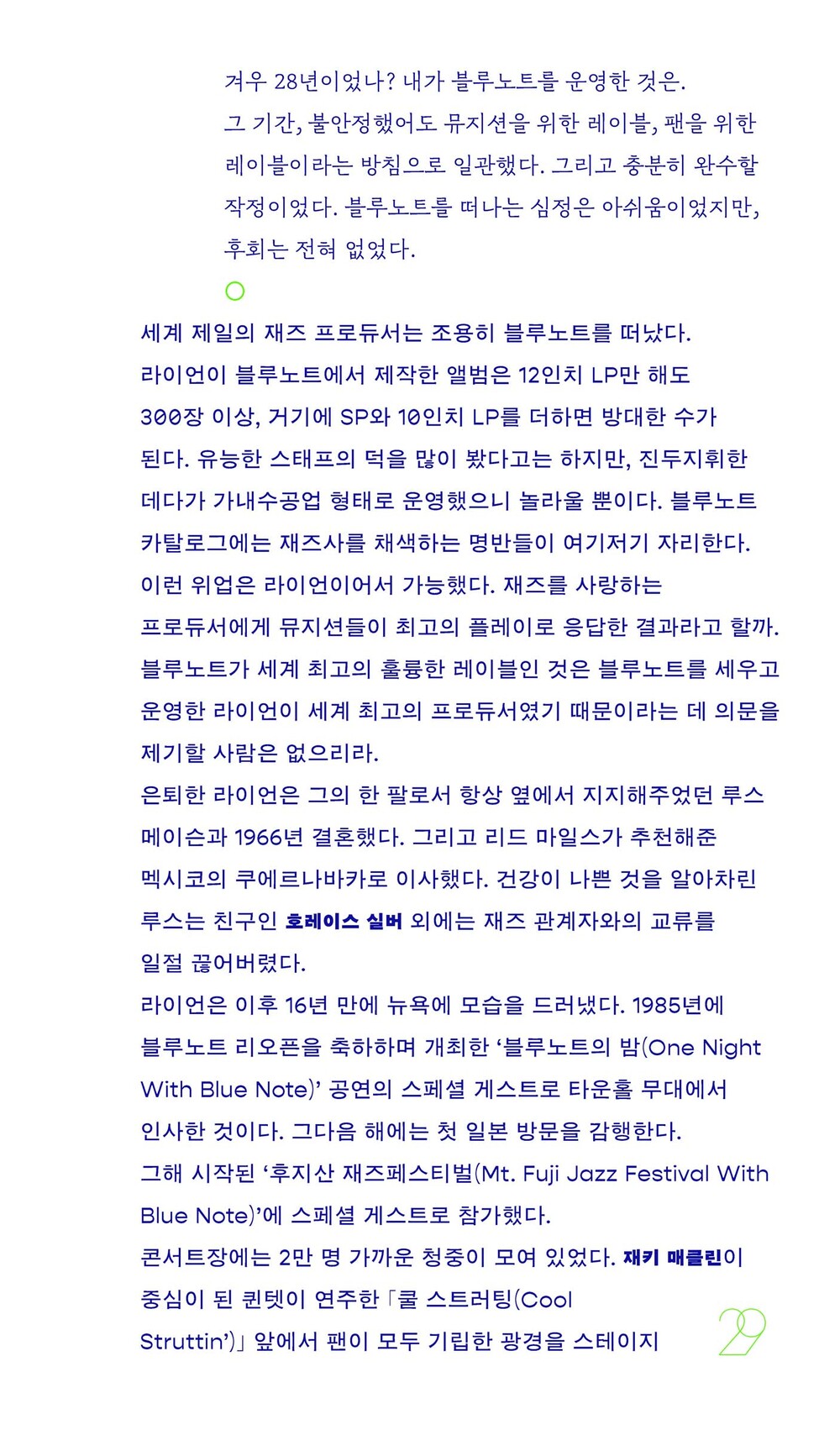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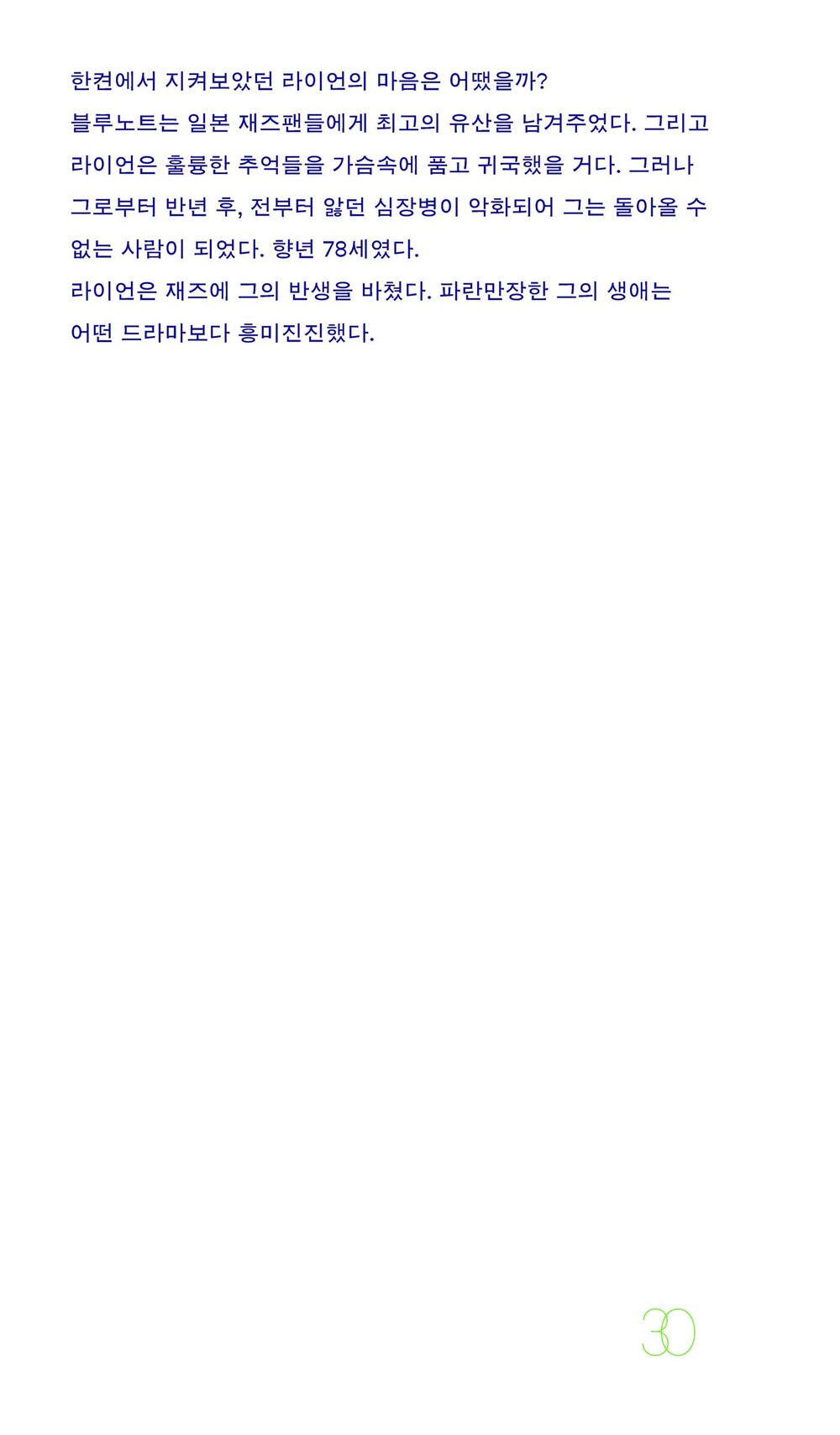
블루노트 컬렉터를 위한 지침 / 오가와 다카오 / 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