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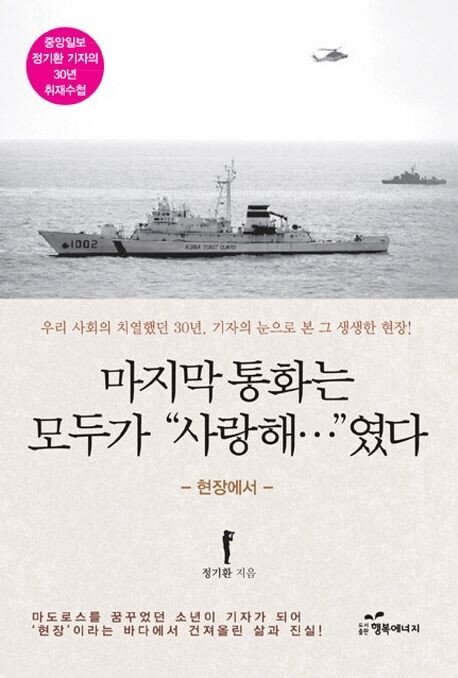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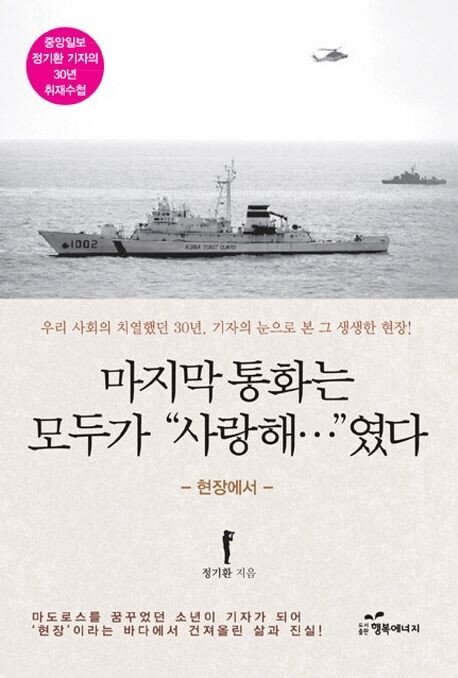
<책 소개>
기자에게 있어 ‘현장’은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책 『마지막 통화는 모두가 “사랑해…”였다』는 솔직하고 담백하다. 또한 감동적이다. 30년 기자 생활을 오직 ‘현장’에서 보낸 베테랑 기자의 글과 삶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사건들이 기자의 글을 통해 되살아나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음각을 새긴다. 사건현장 한가운데에서 써 내린 기사는 차분한 필체를 유지하지만 행간마다 드러나는 뜨거운 호흡은 당시 생생했던 분위기를 독자의 마음에 수혈한다.
<작가정보>
정기환
저자 정기환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가 고향이다.
포항중학교와 경북사대부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 매일신문을 거쳐 198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와 경제부, 특집부 근무와 대구취재팀장, 경기인천총국장을 거치며 30여 년간 현장을 지켜왔다.
<책 속으로>
프롤로그
1975년 12월 세모의 분위기로 들뜬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밤 기차에 올라 있었다. 대학입시 지원서를 내러 가는 길이었다. 가방에 든 지원서에는 지원학과 란이 비어 있었다. 어느 학과에 가야 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채였다. 차에 올라서도 부족한 과목의 책을 꺼내 벼락치기 공부를 시작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회사원 차림 대여섯 명이 우루루 올라탔다. 자기들끼리 떠들며 내 옆과 앞의 좌석을 모두 채웠다. 그들은 판매원의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불러 세웠다. 그때마다 수레 안의 맥주를 모두 비워대며 부어라 마셔라 했다. 속으로 ‘젊은 축들이 돈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맥주는 아주 비싼 술이었다.
기차가 대구쯤에 이르자 일행 중의 한 명이 말을 건네왔다. 맥주가 든 종이컵을 권하며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했다. 시끄러워서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바로 술판에 끼어들었다.
서울에서 내려 온 문화방송 기자들이라고 했다. 당시 부산의 국제시장인가 어디선가 큰 불이 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저마다의 취재 무용담으로 술자리가 달아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형사건을 마무리한 홀가분함에다 취재비도 좀 남았던 모양이다.
난무하는 술잔들에 나도 흥건히 취해갔다. 내가 물었다. “어느 학과를 졸업해야 기자가 되나요.” 일생의 대 실수나 아니었는지.
“어느 대학에 갈 건데?” 하고 물어왔다. 그들 중 세 명이 내가 원서를 내러 가는 대학 출신들이었다. 그중의 둘은 내가 지원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는 학과를 졸업한 이들이었다. “임마, 당장 ○○과로 지원해.” 이미 내 대학 선배나 된 듯 반말이었다.
이튿날 새벽, 서울역에 도착한 기차 안에는 나만 혼자 쓰러져 자고 있었다. 세상에 의리 없는 방송기자들 같으니라고.
어릴적 꿈은 마도로스였다. 방문만 열면 바다가 펼쳐지는 고향이었다. 매일 보는 게 동해 일출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부산 해양대학 지망생 3명이 모임도 했다.
마도로스에 대한 소년들의 꿈은 방랑벽 수준이었다. 한곳에 매이지 않고 천하를 주유할 거라나 뭐라나. 결과적으로 그 꿈은 좌절됐다. 그것도 아주 안 되는 걸로 판명났다.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 보니 기자는 마도로스의 대체재였나 보다. 은근히 비슷한 구석이 좀 있는 직업군이기도 하다.
스물일곱 나이에 발을 들여 30년을 채웠다.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또 21세기다. 마도로스처럼 세상의 이 언덕 저 골짜기들을 많이도 쏘다녔다.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도 하릴없이 분주한 세월이었다.
흰 머리가 내려앉도록 ‘현장’만 지켰다. 무능의 소치일 수도, 드문 행운일 수도 있겠다. 어느 해인가는 가을 추수가 끝난 해 질 녘 들판에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어느 봄날에는 도망가는 취재원을 쫓아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며 한강을 넘기도 했다.
신문기사는 첫 문장이 가장 어렵다고들 한다. ‘현장’은 우선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 머릿 속에서만 맴돌던 첫 문장이 현장에서는 술술 풀려 나온다.
남들처럼 큰 특종을 한 적도 없다.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지도 못했다. 무거운 감투나 훈장도 없었다.
그런들 어쩌랴. 저 가을바람이 한 해를 수확하듯 흩어진 낱알들이나마 모아두고 싶었다. 바다를 떠돌다 사라질 가랑잎 같은 글들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책을 묶어 내는 마음이다. 혹시 이 길을 가려는 후생들에게 작은 참고라도 된다면 더 바람이 없겠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노동자 대투쟁 시기의 기사들을 빠트린 것은 아쉽다. 뚜렷한 글들이 없기도 하지만 디지털 문서로 입력돼 있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신문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비판 기사들-특히 특정인에 대한-은 제외했다. 이제 와서 다시 서로 불편해지기가 싫어서다.
먼저 아내 고봉림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낸다. 모두가 그의 덕분이다. 포항 비학산에 잠드신 아버지와 고향집에 계시는 어머니, 딸 다은, 아들 동승이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가신 장모님, 상주에 계시는 장인어른께도 머리 숙인다. 우리 6남매와 전국의 술친구들도 있다. 인생의 길동무, 우리 ‘세월회’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특히 몸매에 비해 날렵한 후배 윤상구는 이 책의 산파역이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권선복 사장님과 디자인을 맡은 김소영 님께도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10일 묘제를 마치고
고향 바다에서 영일 정 기 환
마지막 통화는 모두가 사랑해 였다 / 정기환 (USED)